 '한상철 선생의 다정한 미소�... '한상철 선생의 다정한 미소�... |
추도사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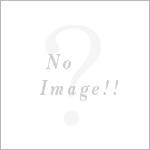 [추도사- ‘한상철 교수 1주기에 부쳐’]
[추도사- ‘한상철 교수 1주기에 부쳐’]
한상철 선생의 다정한 미소가 그립습니다
한 상철 선생, 우리가 당신님을 저세상에 떠나보낸 지가 엊그제 같은 데, 어느 새 벌써 1주기가 돌아왔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 한 선생이 가장 사랑했던 당신의 내자와 귀여운 아들 딸과 친족친지들, 그러고 연극인 모두는 아직도 한 상철 선생을 떠나보내지 않은 채 생생하게 살아 계신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우리의 한 상철님은 시방 이렇게 차가운 자리에 말없이 누워 계시질 않고, 아마도 연희동 본가이거나, 대학로의 어느 극장 안에서, 혹은 연극인 친구 몇몇이 대폿잔을 기울이면서 앉아 있거나 말씀입니다. 한 상철 선생은 평소에 말수가 적은 편이고 도란도란 목소리도 나지막하고, 오히려 남의 얘기를 귀 담아 들으면서 가만히 웃어주는 그 다정한 미소가 바로 일품입니다. 아암, 멋지고 믿음직하고 존경스런 모습이지요. 본인의 연극적 소신과 깊은 생각일랑 오롯이 심중에 감춰두고서. 그런데 당신님은 유명을 달리하고 이처럼 멀리멀리 떨어져 계시니, 진실로 믿기지 않고 참으로 거짓말 같습니다그려!
그러고 보니 한 선생과 내가 얽힌 지난 세월을 하나 추억하지 않을 수 없군요. 1980년대 초반의 4, 5년 동안 일입니다. 그때는 해마다 여름이면 무슨 ‘바캉스’라는 말이 유행가처럼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은 셈이라고나 할까, 여석기 선생님과 한상철 교수와 나, 세 사람은 여름 휴가를 함께 즐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뜬금없이(?) 여선생님의 간단한 제안으로 그 여름철 여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여선생님을 모시고 우리들 셋이 여름휴가를 떠나게 되었는데 일정은 대략 3박 4일 정도. 행선지도 어느 한 해는 동해안 쪽이고, 그러고 그 이듬해 여름엔 남해안 방면으로 떠나게 됩니다. 딱히 특정한 목적지를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어느 하루는 푸른 바닷가, 그 다음날 일정은 바다를 뒤로 하고 산속의 깊은 숲이나 맑은 개울가로 자리를 옮겨가기로 합니다. 푸른 바다와 깊은 산속을 한꺼번에 보고 즐기는 셈이지요. 그러니까 행선지만 대충 정해 놓고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 산속으로 정선 땅 오지를 한번 가봅시다. 그 애오라지 뱃사공과 정선아리랑으로 유명한 --” 하고 말하는 정도가 고작입니다. 처음의 출발일정은 작게 잡아서 3박 4일 정도. 그렇지만 형편 따라서 그때그때 4일간도 좋고 5일간도 좋고 날짜는 천연될 수도 있으니까, 어느 해엔가는 느긋하게 1주일 정도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와 한 선생은 집 전화가 없었던 시절이라서 무소식이 곧 희소식인 셈이죠. 그리하여 한번은 동해안 바닷가에 들렀다가 정선 산속으로 들어갔었고, 또 어느 해는 남해안을 목적지로 해서 상주해수욕장과 해남의 대흥사 큰절과 고산 윤선도(孤山 尹善道) 고택(古宅), 신지도 섬의 명사(鳴砂)해수욕장 등등 여기저기 갈지자(之字) 행보였습니다. 우리들의 그 여름 여정은 뭐- 바쁘게 서두를 것도 없었고, 쉬엄쉬엄 산보하듯이 산천경개 구경차로 더디고 늘어진 여행 길이었습니다. 차편이야 형편 따라서 기차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잠자리는 언제나 여관방 아닌 민박집, 밥 해먹는 취사 당번도 항상 고정적이었습니다. 우리 3인이 각자 배낭 속에 챙겨 온 밑반찬과 코펠 같은 용기들을 몽땅 꺼내놓고, 쌀 씻고 밥 앉히고 국을 끓이는 일은 한 선생이 도맡았었고, 여선생님은 옆에서 계란 프라이를 만들거나 달걀 풀어서 그냥 스크램블 만들어내는 것이 주특기. 그러고 나면 제일 연하인 노경식의 할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지요. 노경식이는 잔심부름으로 샘에 가서 물 떠오고, 가게에 들러서 안주거리와 병술 사오고, 식사 후에는 밥그릇과 양재기 씻어내는 설거지 하고, 그러고 또 여행경비의 계산과 회계를 책임 맡는 것이 나의 몫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무더운 여름밤이 짙어가면 우리 셋은 둘러앉아서, ‘쐬주 잔’을 기울이며 설왕설래 한국 연극계의 뉴스거리와 이런저런 객담과 문제점들이 화제의 중심에 오릅니다. 무엇이 어쩧고 누구누구 아무개는 어떠하고, 한국연극의 오늘날 과제와 내일은 어떻다는 등등, “한국연극의 현실”이 도마 위에 올라서 ‘춤 추고 요절나고 작살이 나는’판입니다. 편안하게 서로서로 술잔 권하고 마시고 먹고 웃음꽃을 피우면서 -- 그처럼 우리나라 연극에 대한 화제와 열정은 여름밤이 이슥해질 때까지 그칠 줄을 모릅니다. 어느새 밤 열두 시의 자정을 훌쩍 넘기기 일쑤이고, 어떤 때는 새벽 한 시 두 시의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까지도. 그제서야 여선생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자- 그만 한숨 눈 붙입시다. 벌써 열두 시가 넘었어? 허허. 또 내일 일정이 남았으니까.”
한번은 해남의 대흥사 큰절 아래 민박집에서의 일입니다. 우리가 늦은 아침을 짓느라고 마당가에서 부산(?)을 떨고 있는데, 갓난애를 포대기 둘러서 등에 업은 주인집 늙은 할머니가 상추 쑥갓 같은 풋것을 한 줌 뜯어서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웃음을 머금고 고개를 갸웃하며 하는 말씀이,
“넘들은 식구끼리 가족으로 바깡쓰를 댕기는디, 뭣 허는 사람들이래요. 재미도 하나 읎이 사내들 남자끼리만 셋이서? --”
“하하하! --”
그러자 여선생님은 하늘을 쳐다보고 유쾌하게 홍소를 날렸습니다.
생전에 한 상철 선생은 이같은 우리 추억담을 어느 잡지에 멋지게 풀어쓴 적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이들과 떠난 그해 여름>이라는 글 제목으로 한국문화예술위가 발행하는 『문화예술』(2003년 8월호)에다가, ‘지리산 화엄사’에서 우리 셋이 함께 찍은 소박하고 멋진 기념사진 한 장을 곁들여서 --
딸깍발이 샌님 한상철 선생이여, 길이길이 명복을 누리소서.
우리 연극인은 한 선생님의 다정한 미소가 그립습니다!
2010년 8월 12일
노 경 식 절
|
